박명인 미학산책 '경험과 구성의 다양성' Ⅱ
수의 경우에도 하나하나의 수가 한 개의 개념적 개체로써 독자적인 징표나 규정을 갖춘 한 개의 대상이다. 그 독자성은 그것 자체로서의 수의 체계에 속한다. 수의 독자성은 각각의 수의 총체에 대하여 순수한 순서 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체적인 것도 순수한 위치 값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각각의 지각은 계열에서 단순한 하나의 위치 이외의 것, 그 이상의 것이 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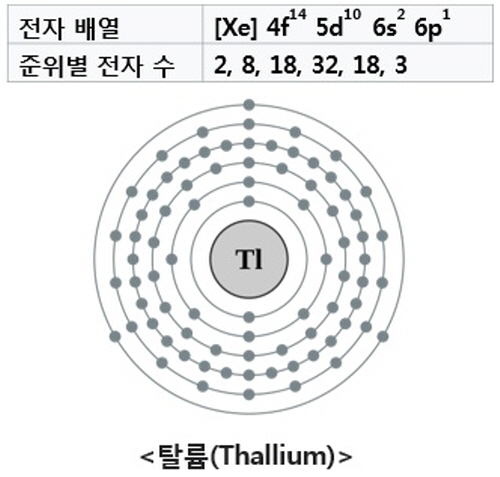
그것은 독자적인 자력으로 존립하고, 지각의 의미는 이러한 특수성에 있다. 확실히 지각도 공간의 전체라든가 시간의 전체로 끼워 넣어져 있다. 그러나 지각은 단지 언제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규정으로 환원되지 않고, 유일무비(唯一無比)한 내용으로 공간의 각각의 점과 시간의 순간을 채우는 것이다. 각각의 지각은 관측자만의 특수한 공간적·시간적 제조건으로 직접 주어진다. 그 지각이 고립된 상태로부터 어떻게 해서 탈출하고 어떻게 해서 다른 지각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인가는 예상하기 어렵다. 바로 이 결합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이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제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재적인 이질성이 없는 지각은 본질에 속하는 질적 특수성을 잃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을 갖고 있는 지각은 지식이나 이론적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체계 형식에 짜 넣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거나 사실적으로 동등한 근거로 성립하면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안티노미(antinomy)에 자연과학의 모든 개념 형성의 최초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 변증법적 맹아가 숨겨져 있다. 물론 사고는 수학적 대상의 영역에서 물리적 대상의 영역으로 이행하자마자 독자적인 사고 형식과 제반 전제를 내버리는 것은 아니다.
제반 전제를 소여가 그것에 내보이는 저항에서 보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는 바로 이 저항으로 인해 사고에 묻혀 있던 새로운 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사고는 이른바 불가능한 것을 수행하려는 요구를 마치 사고와 무연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바로 그것에 의해 정립되어 사고의 구성적 제조건에서 출산한다. 그렇게 고찰하는 요구를 스스로 부과한다. 지각은 당장 단순한 사실적 다양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나타나지만, 개념적 다양이라는 형식에 전환하려고 한다. 자연 인식의 역사에서 힘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물리학적 사고는 이러한 전환이 가능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문제를 즉시 요청으로 바꾸어 버린다. 즉, 이 사고는 여기에 어떤 개념의 아포리아(aporia)를 행위로 변하게 하여 사고의 행위와 더불어 모든 자연과학적 개념 형성이 시작된다.
사고의 논증적인 본성은 소여의 계열을 수용하는 만큼 실제로 통람(通覽)하는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사고가 통람하는 것은 어떤 항목으로부터 다른 항목으로 잇달아 인도해 가는 이행 규칙도 동시에 묻는다. 결코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청되어 찾을 수 있는 것뿐, 이 규칙이야말로 자연과학적 사고가 독자적인 사실성을 단순한 사실 인증의 모든 형식으로부터 구별하는 특징이다. 결코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색에 의해 요구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사고가 독자적인 사실성을 단순한 사실 인증의 모든 형식으로부터 구별하는 특징으로 계속한다. 물리학적 사고로 확인되는 사실적 진리로도, 물리학적 이성(ratio)의 특수성으로부터 규정되어 그것에 침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제반 사실이 다른 영역의 역사학적 제반 사실과 비교해 보면 결정적으로 밝혀진다.
‘최고는 모든 사실이 그대로 이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괴테 말의 정확함과 깊이를 여기에서 증명해 보자면 최종 결정적으로 확정하고 바뀌지 않는 절대적 여건과 같은 의미에서의 사실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미 얼마간의 방법으로 이론에 의해 방향을 정하고, 어떤 종류의 개념체계에 비추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론적인 규정 수단이 단순한 사실적인 것 다음에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특수한 시점이 처음부터 물리학의 사실을 역사학의 사실로 구별하고 있다. 앙리 포앙카레(Poincaré, Henri)가 『과학과 가설』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카라일(Carlyle)은 예전에 어디에선가 이런 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