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 태도론 Ⅲ
이 재미의 개 념은 스위스의 미학자 술저(Sulzer)에 의해 미학사전 『예술의 일반이론』 (1771-74)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세워지고, 이 항목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백과전서』에 수록되어 있다.〈Diderot편 『백과전서 서론』〉 그때 술저는 프랑스어의 어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독일어로 das Interessante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문헌에서 술어화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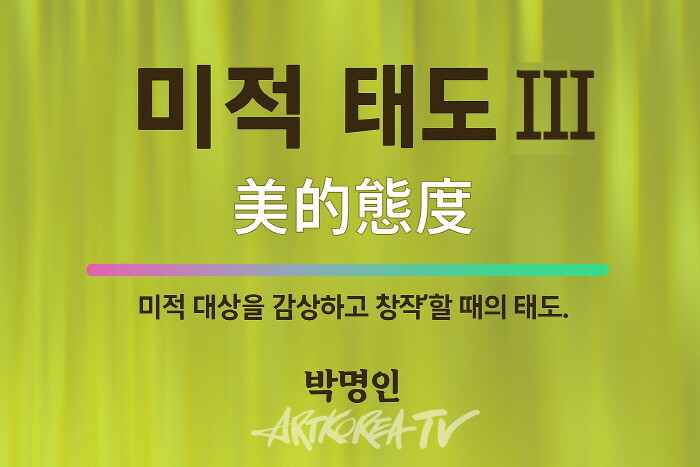
그 ‘재미’는 분명히 작품에 있는 힘이다. 거기에서 술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단지 재미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강한 관여를 강요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드라마에서 일종의 공연자로서 참여하고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희망을 얻는다. 그는 말한다. ‘재미야말로 미적 대상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질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예술가는 일거에 예술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J·G·Sulzer, Allgemeine Theorie der schnen Knste, p. 692b〉 예술의 목적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interessant한 것이란 이해나 사욕과 무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술저는 강조한다.
자기애 혹은 사욕이야말로 내적 활동의 원천이다. ‘재미있는 대상은 다소 정신의 내적인 활동성(innere Würksarnkeit)을 높이지만, 이 활동성이야말로 본래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연이 바라는 것은 생생한 활동적인 인간, 활동성을 갈망하는 인간이다.’〈Ibid., pp.692b-93a〉 요컨대 ‘혼의 활력’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역할이며 이 목적은 인간의 본성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근세에 있어서 칸트의 무관심성 개념의 비판적 사상을 다시 더듬어 보기로 한다. 미에 대한 태도로서의 무관심성이라는 사상은 칸트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관심의 미학과 함께 무관심성의 미학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술이 허구의 세계를 전개하는 것은 실천적인 태도와는 다르 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그때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현세적인 행동원리로서의 관심이라는 개념을 내세운 사상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부정으로서의 무관심성(행동하려고 하는 태도를 도외시하는 것)을 미의 체험의 특질로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고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무관심성이라는 말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정념으로서의 기쁨에 대한 ‘지적인 기쁨’을 세우고, 비극을 보고, 엘레지(elegy)를 들을 때, 우리들은 정념으로서의 슬픔과 함께 지적인 기쁨도 경험하고 있다는 데카르트(Descartes)에서 하나의 선구적인 형태가 인정을 받는다. 정념이 현실에 관여하는 감정인 것에 대해서 지적인 기쁨은 문자를 통해, 현실과의 관계를 초월하는 감정이기 때 문이다.
섀프츠베리(Shaftesbury)에서도 미의 향수로부터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느끼는 태도를 경계하고, 순수한 관상(觀想 conternplation)에 머물어야 한다는 사상이 인정을 받는다.〈Shaftesbury, The Moraliste, a Philosophical Rhapsody, part, Ⅲ, Sect. 2(1709)〉 그리고 섀프츠베리의 사상을 계승한 허치슨(Francis Hutcheson)에서는 명확히 관심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이 보인다. 다시 말해, 미와 조화의 감각이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부터 ‘그것은 이익의 예상으로부터 생기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허치슨 『미와 덕의 개념의 기원』(1725) 제1부 14절, 32쪽〉 이 계열의 미학은 현실 경험에서 미의 특수한 위치를 특별히 정하는 것을 노리고, 그 의미로 관상성(觀想性)의 계기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활동적 생과 관상적 생을 대비하는 중세의 사상을 계승하고, 관상적 생을 중시하는 가치관도 계속된 사상이라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