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순수성이냐 상업성이냐?
김종근 미술평론가
인기 있고 성공한 미술 작품은 어떻게 그려야 가능할까?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기준을 예술성과 상업성이란 기막힌 조화와 경계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를 변별하는 데도 딜레마는 존재한다.

근대의 예술은 대중의 희망과 기호에서 멀리 있지 않았다. 모든 중심에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예술이 통용됐다. 그러나 20세기 모더니즘이 득세하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술은 일상과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 아방가르드를 앞세운 미술은 대중과의 친화보다는 미술 자체를 위한 개념이나 행위를 진지한 예술로 여겼다. 대표적 사례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베니스 비엔날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유명한 전시 기획자들은 대중의 염원이나 희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는 전위적 예술 전시를 선보였다. 비엔날레를 “미술에 의한, 미술인을 위한 파티”라고 거침없이 부르는 작가들의 발언에서 현대미술이 얼마나 예술성이란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존재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미술은 상업성을 추구하는 갤러리와 컬렉터들에 의해 예술성과 상업성의 충돌에 직면하게 됐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대 미술품 유통의 현실에서 누구도 순수성과 상업성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상업성만으로 치닫는 미술시장에서 비평가들의 상업성에 야합하는 작가를 향한 비판도 정당하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베르나르 뷔페도 그러했다. 한때 프랑스 최고 예술가로 칭송받던 뷔페는 조각가 세자르와 함께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비평가들로부터 냉혹한 대접을 받았다. 순수보다 상업성에 맞춰 그림을 그렸다고 낙인 찍혔고 화랑의 돈벌이에 야합했다고 따돌림을 당했다. 죽기 전까지 인간과 죽음에 관한 고민을 치열하게 성찰한 그림을 그렸던 뷔페였지만, 비평가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20세의 나이에 천재라고 불렸던 작가에게 모두 등을 돌렸다. 그렇게 뷔페는 71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제 순수와 상업성의 열기가 한국 미술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 유명 화랑 15개가 한국에 진출해 있다. 2019년 4960억원이었던 순매출은 이제 1조5000억원을 넘나들고 있다. 예술가를 더욱더 상업성으로 몰아가는 아트페어는 100여개가 훨씬 넘는다. 아트페어의 목적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림을 많이 파는 것이다. 아무리 예술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들에겐 상업성이라는 현실적인 논리가 언제나 앞선다. 어느 화랑이 더 예술성 높은 작품을 내놓느냐보다는 누가 더 많이 작품을 파느냐, 누가 더 인기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나와 컬렉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예술이 한없는 상업성에 굴복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철학자 아도르노는 “상업성에 종속되지 않은 예술이라는 개념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이 시대의 어떠한 예술도 상업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탄생할 수 없으며, 소비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속에 함몰된다는 의미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술은 어떤 예술도 상품성과 별개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예술은 이제 특정 계층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손쉽게 소유할 수 있는 상품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제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대중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예술을 수정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슬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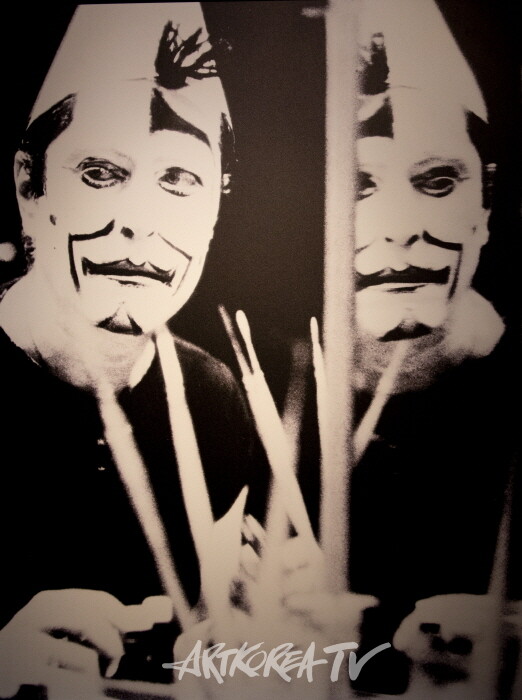
예술은 위대한 창조성을 전제로 하지만 어떤 예술이든 상업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공한 예술작품은 50%의 상업성과 50%의 예술성의 인기 있는 조화에서 빛난다. 미국의 한 평론가는 앞으로의 미술사는 인기와 유명 작가들에 의해서 쓰일 것이라고도 장담했다. 우울한 예언이지만 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