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리역 폭발 48주기, 잊힌 추모의 자리에서 다시 묻는다
글 박동 칼럼니스트
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
그날 이리역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도시의 절반이 무너졌고, 65명의 생명이 사라졌으며 1,300여 명이 다쳤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산업재해 중 하나였지만, 48년이 지난 오늘 이 비극은 조용히 잊혀지고 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정확히 사고가 일어난 시각에 맞춰 익산역을 찾았다. 11월 11일, 추모를 위한 국화꽃을 서울에서 미리 준비했다. 22년 전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꽃도 구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섰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1시간 20분 동안, 이번 추모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질문을 다시 꺼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48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무엇을 고쳤고, 무엇을 고치지 못했는가.”


익산역에 도착해 추모탑으로 향하는 길은 적막했다. 그 시간에 누군가 몰래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금세 사라졌다. 추모탑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역사 건물에서 쏟아지는 희미한 조명만이 탑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익산역 플랫폼에서도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들이 이날이 ‘이리역 폭발 48주기’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추모탑 앞에서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희생자 6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새겨진 글씨는 흐릿해졌고, 빛이 닿아야만 이름이 보였다.
이 순간 마음을 짓누른 것은 죽음의 무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회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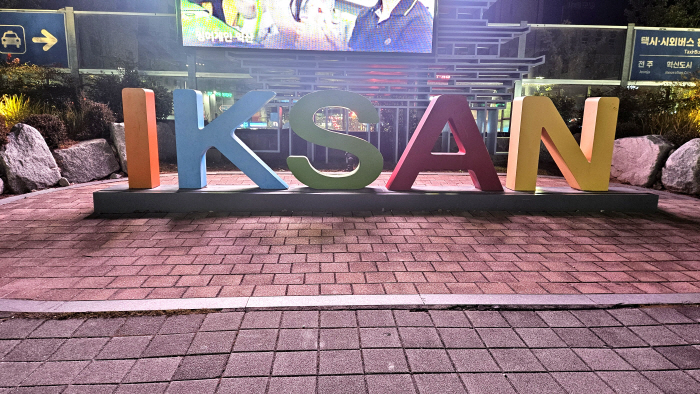

이리역 폭발의 원인은 철도 문제가 아니라 ‘화약류 관리 부실’이었다.
그러나 48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화약류 안전관리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나는 누구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해 왔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폭약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고, 정보 체계 역시 오래된 방식에 머물러 있다.
“1977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식적인 추모식은 사고 33주기였던 201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올해에도 철도본부와 유족회 몇 명이 조용히 참배를 했을 뿐이다. 그들의 추모는 진심이었지만, 국가적 기억은 이미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추모탑 주변에 놓인 노란 국화꽃 화분만이 누군가 여전히 이곳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추모를 마친 뒤 뒤돌아서는 순간, 마음 한쪽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잊혀가는 것이구나.”


이리역 폭발탑 맞은편에는 1950년 7월,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민간인을 위한 또 다른 추모비가 있다. 두 번의 폭발, 두 번의 민간인 희생. 그러나 이 두 사건 모두 지금의 익산에서는 그 흔적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우리는 왜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비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가.
추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 나는 다시 사진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내가 화약류 안전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하고 주장했던 일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국가 시스템 안에서 변화가 가능하기는 한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이 떠올랐다.
기다려주는 사람들,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 책임.
그날 익산역에서의 추모는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향한 질문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였다.

이리역 폭발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잊으면 다시 반복된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기록은 안전을 향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우리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의다.
나는 다시 다짐한다.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록하고, 계속 질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