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호(KIM CHAN HO) 미술평론가
작가 박찬상은 고정된 형식에 머물지 않고 현실과 환영幻影의 미학적 경계를 기호와 상징으로 미래 지향적 담론을 보여준다. 평론가 장석용은 박찬상에 대해 “의식의 흐름을 패턴화하는 독특한 사고와 표현 방식과 섬세한 조응력照應力, 감탄할 인내력으로 회화와 설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작업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작가다.”라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비평가 장 루이 푸아트뱅(Jean-Louis Poitevin, 1955~)은 “박찬상의 작품은 인간의 비밀을 천착穿鑿하려는 끈질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의 그림의 깊이는 바깥을 향하는 시선이 아니고 사물들 틈에서 탄생한다.
내 생각은 작품에 있고 작업 자체가 이야기다. 큰 주제만 잡고 구체적인 상징과 기호들은 의식의 흐름에 맡긴다. 보여진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치환置換시키면 된다. 이것이 내가 그림을 통해 감상자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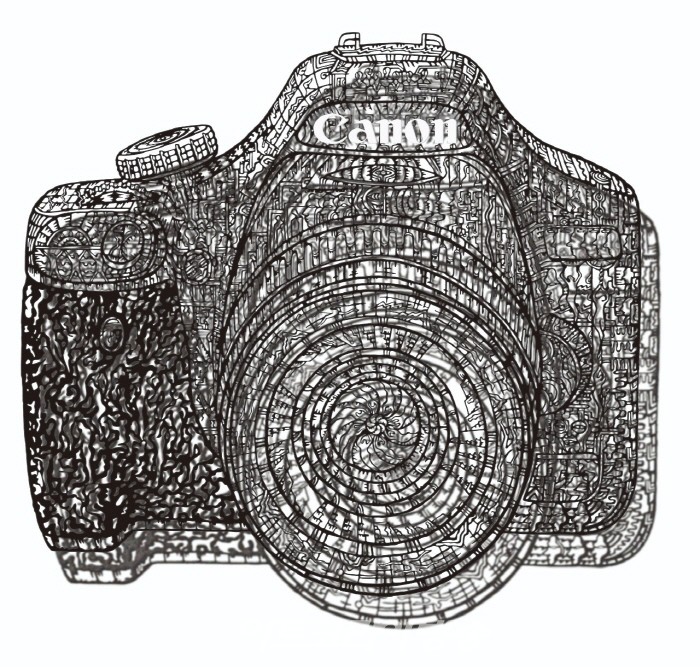
(「박찬상 작가와의 대화」, 연희동 박찬상작업실)
빛이 오브제를 만나 그림자를 만든다. 빛·오브제·그림자는 결국 하나가 된다. 그는 타자他者와 자아自我 속의 경계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무계획의 계획을 보여주며, 자신을 드러내고, 숨기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은 다르지만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철제 프레임이 자아라고 하면 타자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조명에 따라 달라진다. 타자와 자신의 관계를 찾아가는 작업이며,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석席>은 빛·오브제·그림자가 한 화면에 펼쳐지고 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놀이와 같다. 존재론은 실재론이다. 아름다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그림에 감동하는가? 그림은 어떻게 예술적 내용을 전달하는가? 음악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음표를 통해 음으로 감정을 전달하듯이, 그림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기호와 상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한다. 그림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물질화하고, 그 물질화된 대상을 통해 다시 내적으로 파고 들어간다. 박찬상은 결국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상상하는 것과 실재적인 것을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로 일체화시키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다.

그림자가 실루엣이고, 비어있는 사람 자체가 실루엣이다. 타자에 의해 내가 규정되는 것이고 비어있어 보이지만 채워져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비움과 채움의 존재론적 성찰을 통해 상象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상象에 의해서 타자가 반영된다. 실루엣silhouette과 그림자는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혼용되어 있다. 철 작업에서는 조명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그림자들은 존재에 의한 반영이다. 그림자가 오히려 진실한 모습이 될 수도 있으며, 철판의 형상이 오히려 진실한 모습일 수도 있다. 진실과 허상은 항상 대립하면서도 공존한다. 무형과 유형의 담론, 존재의 모습 자체는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작가 박찬상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작품에서 작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작품 행위는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구성하는 행위, 즉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그 자체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기호와 상징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성becoming에 있다. 다시 말해 작가의 작품은 과정과 인식의 흐름에 있으며, 그림 공간은 현실現實과 환영幻影의 경계에 놓여있다. 그는 의식의 흐름을 패턴화하여 설치·평면·입체의 경계를 넘어 낯설음을 지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