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 김미영 기자]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휴에서는 2021.6.11.-7.15까지 김창영 개인전 '역대 길었던 장마'가 전시되고 있다.

김창영 작가는 겹겹이 쌓아 올린 옅은 색의 중첩을 통해 이전 작업보다 한층 더 가볍고 간결해진 풍경을 구현한다. 작가는 그간 서로 다른 시공간의 풍경 이미지를 섬세하게 결합하는 작업을 통해 모노크롬의 새로운 형식을 지속적으로 실험해왔다. 자연과 인공적 풍경의 특징을 각각 곡선과 직선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무한히 내려 긋는 붓질의 반복을 통한 수행적 자세로 한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는데 몰두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대립이나 갈등적 구도를 배제하고 색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율동을 통한 안정미와 균형감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숙련된 층위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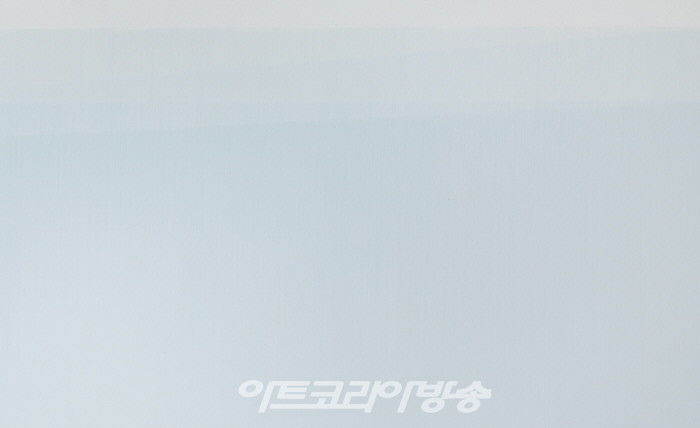
작가는 무한히 붓을 내려 긋는 반복을 통해 마치 수행자와 같은 태도로 캔버스를 다룬다. 이는 작가가 작업의 밑바탕이 되는 캔버스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창영 작업의 표현적 특징은 회화적 질감과 두께를 전혀 드러내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작업은 회화의 밑바탕이 되는 캔버스의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백칠로부터 시작된다. 백칠은 본래 물감의 발색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나, 김창영의 작업에서는 그 작용이 반대로 적용된다. 오히려 색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곱게 다듬어진 캔버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다. 백칠이 마르면 화면 전체를 곱게 갈고 다시 백칠을 하고 말리고 가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다. 이 지난한 과정을 지나면 캔버스의 표면은 백자나 실크의 그것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워지는데 이때 작가는 비로소 색을 올리기 시작한다. 어떠한 내러티브도 유추할 수 없는 오직 색채뿐인 화면 안에서 그의 멀어짐과 가까움, 짙고 옅음, 선들의 운동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마주한 풍경과 심상에 도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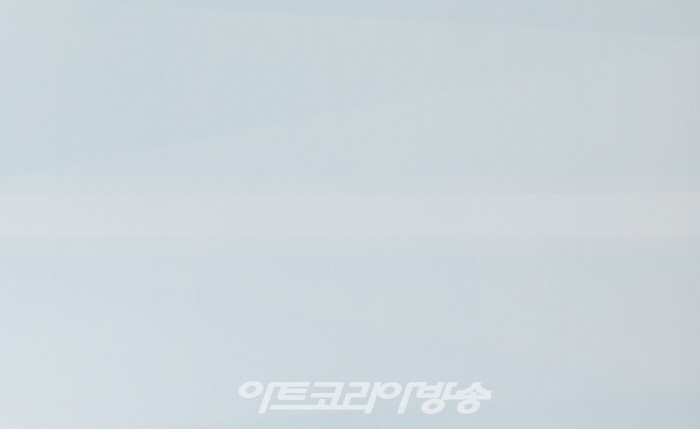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비전속작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창영 작가의 개인전이다.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은 전업 미술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에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창영은 추계예대 서양학과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어울림미술관, 세종미술관, 아트노이드178 등지의 기획전에 참가했다. 2018년 제7회 종근당예술지상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휴+네트워크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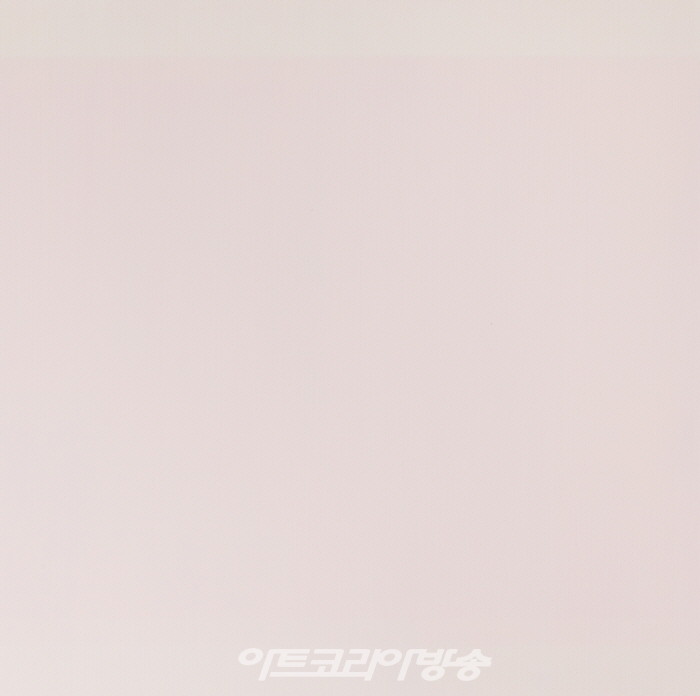
관념과 현실의 중간지대
윤진섭(미술평론가)
김창영은 그림을 그리되 아무 것도 그리지 않는다. 이 역설! 그렇다. 김창영은 역설의 작가이다. 그에겐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美術), 그중에서도 회화(繪畵)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대상을 화포(?布)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우기 때문이다. 이 존재의 자기부정! 김창영의 그림이 개념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김창영에게는 또 하나의 레테르가 있다. 이른바 ‘단색화(Dansaekhwa)’라는 칭호가 그것이다. 지난 십 여 년간 커다란 물결을 이루면서 세계 미술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이 단색화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심성을 밖으로 표출시킨 동인이었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내려오면서 서서히 형성된 ‘흰색’의 이미지, 그것이 김창영의 단색화 화면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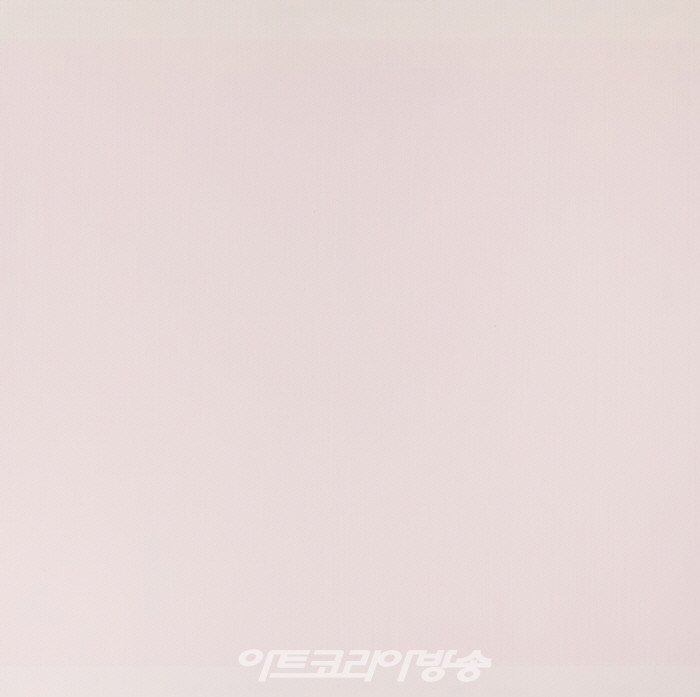
오래 전부터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휴의 레지던시에 머물면서 파주 인근의 자연 경관을 봐 온 김창영은 통일전망대와 임진강으로 대변되는 남북 분단과 그로 인한 이념적 대치 상황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은 그를 자연스레 관념이 아닌 현실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색화와 같은 극단적인 순수 추상화와는 상반되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자장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글의 서두에서 그의 그림을 가리켜 하나의 ‘역설’이라고 한 이유이다.


